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은 크게 채권자와 주주ㆍ지분권자로 구분된다. 채권자의 채권은 다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과 조정 대상이 되지 않은 채권으로 구분된다.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는 채권은 공정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회생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게 되는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 으로 구분된다.

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회생신청이후가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이 난 이후) 새로운 거래관계를 맺음에 따라 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채권’이라고 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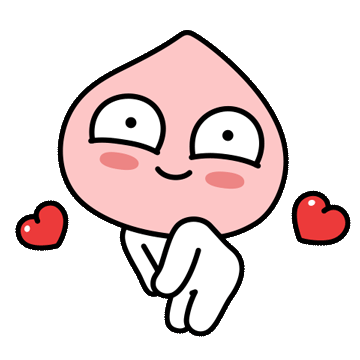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은 채권목록제출과 채권신고가 필요하며(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가 없으면 실권),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조정이 된 이후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되지만(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공익채권은 목록제출이나 채권신고가 원칙적으로 불요(다만 실무상 공익채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신고함)하고, 회생계획의 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될 수 있다(법 제180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있을 경우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잘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이라면 우선 채권신고기간 이내에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중에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서 (일부)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익채권이라면 이러한 채권은 채권신고가 원칙적으로 불요하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도 수시로 관리인에게 전액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은 "공익채권을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것만 가지고 바로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회생채권(조세채권 포함),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강제집행 가능 여부, 회생계획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회생계획에서의 변제율 등에 있어 달리 취급되고, 특히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의 규모는 채무자의 자금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차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판단과도 직결된다.
요약 페이지 ( ↓ 클릭 ↓ )

'ㅇ기업회생 > ㅡ기업회생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 (1) | 2023.08.16 |
|---|---|
| 회생채권 (1) | 2023.08.16 |
| 공동담보의 보전 -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 (0) | 2023.08.16 |
| 공동담보의 보전 - 상계의 금지 (1) | 2023.08.16 |
| 공동담보의 보전 - 상계의 제한 (1) | 2023.08.16 |





